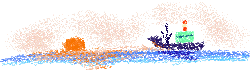굽어진 강물에 별빛을
靑波 채 해 송
그랬던가,
마주하지 못한 울분 때문에
밤낮의 길이로
그렇게
거친 숨결을 딛고 달려와 발아래 스러졌던가,
뒤돌아보지 못한 시간 속을
폭풍 같은 크기로 그렇게 울었던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자학의 멍에를 쓰고 살아온 날들이
가을처럼
뚝뚝
허무로 떨어져 내리는데
어찌 통곡을 모르고 한(恨)을 게워낼 수 있겠는가
흔들리는 추억의 끄트머리를 놓치고
의미도 모른 채 흩어지고 마는 상심의 깊이를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아직 눈물이었을까
기억조차 허락하지 않는 허무를 동이고
굽어진 잔등위로 별빛을 쓸어 담은들
흐려진 날들은 다시 길을 낼 수는 없지만
나는 아직 별빛 한 자락만으로
바람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둘 것이다
저 먼 부토의 시간까지
20090908(0510)靑波